'화려한 휴가', '7광구'의 김지훈 감독이 '타워로 돌아왔다. '타워'는 2013년 첫 400만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순항중이지만, 그가 인터뷰 내내 가장 많이 한 말은 "공부를 더 해야겠다'였다.
"흥행이 돼 좋다기 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7광구'로 인해)스태프나 배우들, 관객들에게 실망을 많이 드렸잖아요. 영화적인 흥행을 떠나서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줘서 이번에는 상처를 안 줘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많이 봐 주셔서 그런 점에서는 우선 안도가 돼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묻자 "지금은 칭찬보다는 아쉬운 면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신다. 비판이 아프긴 한데 도움이 된다. 좀 더 공부해서 발전을 더 해야겠다"라고 전하며 겸손함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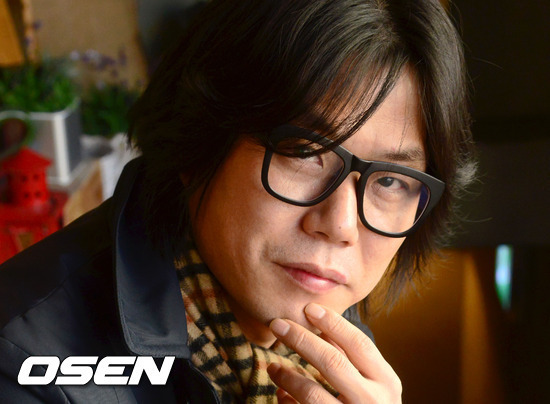
김 감독은 재난 영화의 특성상 드라마를 장르물에 맞춰 찍으려했다. 하지만 드라마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재난영화 장르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사건이나 액션에 분배가 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 대한 요구들에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러닝타임이 대표적이다. 영화 안에 드라마를 좀 더 풍부하게 담으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CG양이 많아져서 제작비 감당이 안 됐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다.
또 러닝 타임을 맞추기 위한 연기의 편집. 배우들이 아쉬워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액션 장면들이 많이 삭제됐는데 처음에는 당황해하다가 전체를 또 보고 감독이 고민한 지점을 다 이해해 주시는 같다. 어떤 배우분들은 '뭘 그래, 난 다섯 신 중 두 신 잘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배우와 감독의 끊임없는 간극일 수 있는데, 베테랑들이라 전체를 보려고 하시더라. 그런 점이 감사하다"라며 배우들에게 미안하고도 고마운 마음도 드러냈다.
사이즈 큰 블록버스터를 연달아 찍은 김 감독의 진짜 취향이 궁금해졌다. 그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며 "40세가 넘어가니 여러 이야기를 만들기 보다는 한 이야기를 깊게 고민하고 싶고 한데, 나는 철저히 대중영화 상업영화 감독이라 관객분들에게 맞추고 싶다. 하지만 '7광구'는 소통이 안됐고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봐주셔서 소통을 재개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솔직하게 전했다. 최근 가장 인상깊게 본 재난 블록버스터로는 '2012'를 꼽았다.
그는 영화라는 것이 산업과 함께 발전해 왔고, 거대 자본이 감독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독으로서 그런 상황에 균형 감각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시 덧붙이는 말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좋아하는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 '인생의 아름다워', '시네마 천국' 등이다. 스스로 '착한영화'를 좋아한다는 김 감독은 "와이프가 흥행을 하려면 나쁜 영화도 좀 찍어야 하는데 너무 착한 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더라. 하지만 요즘 영화계에서 착한 영화를 찍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란 감독의 생각이다.
촬영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에게 착한 감독이냐고 물었더니 "15년 영화를 했는데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줬다라. 감독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7광구'에 이어 '타워'를 찍으면서 성장통을 겪은 것 같다는 그는 "내가 행복하게 영화를 하면 스태프, 배우, 관객들도 모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불행해지더라"며 "이제는 좀 철이 든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배우들을 웃길까란 생각으로 촬영장에 간다. '오고 싶은 현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촬영장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전했다.

화제를 돌려 이번 영화의 CG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드라마적인 부분에는 이견이 있다 하더라고 '타워'가 한 단계 발전한 한국영화의 기술력을 보여준다는 것에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실사와 CG를 잘 구분 못하겠더라"고 말하자 "나 역시 헷갈린 적이 있다. CG를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스태프가 '감독님, 저거배우들과 진짜로 찍은 실사인데요'라고 하더라"고 대답하며 웃어보였다.
"너무 CG가 좋아서 다른게 안 보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하. 이번 영화의 가치를 테크놀로지에 많이 뒀어요. 어릴 때부터 '백 투 더 퓨처', '스타워즈' 같은 할리우드 영화가 주는 판타지 테크놀로지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3D 영화도 했던 거고요. 한국영화 감독들이 할리우드와 경쟁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할리우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무모한 도전인지 무한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감독들에게는 자신의 여정표가 있는데, 이 시기에 '타워'는 제 로드맵이 된 것 같아요."
이와 함께 한국에서 CG를 구현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도 하나 들려줬다. "처음 '타워'의 CG 작업 때문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 쪽 관계자들이 우리 예산에 그런 기술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기가 생겼죠. 우리 CG 기술팀이 미국에 가서 '어벤져스'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6개월 에 2컷 작업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6개월에 한 명이 200컷을 작업 해야하죠. 미국의 자본력과 인프라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자본이 적고 인원이 부족하지만 열정이 있죠."
그가 가장 힘든 장면으로 꼽은 것은 화물 엘리베이터 신이다. "배우들을 이틀 동안 가둬 놨어요. 물도 줄로 매달아 줬고,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기중기를 사용해 떨아뜨렸죠. 볼 때마다 배우들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에요. 다시 찍으라고 하면 못 찍을 것 같아요. 다른 장면들이 육체적인 공포였다면 그 장면은 정신적인 멘탈 이 힘들었습니다."
'화려한 휴가'를 통해 흥행 감독이 된 이후 '7광구'로 뼈아픈 경험을 하고 '타워'로 재기에 성공한 그는 스스로 "집행유예기간이 풀려야 한다"라고 말한다.
"대중 영화 감독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과 후회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초기는 후회였다면, 지금은 반성이에요. 관객들과 소통을 잘 할수 있는 감독이 되고 싶고, 제 나름대로 영화를 하며 쌓은 노하우를 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유행을 쫓아가는 감독이긴 한데 '김지훈표 뚝심'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죠. 물론 쉽지는 않겠죠."
nyc@osen.co.kr
정송기 기자, ouxou@osen.co.kr













